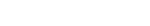Criticism
나머지 공간과 시간이 배제된 지금 여기
세계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동일성도 상이성도 아니며, 어디서 비롯된 것도 비롯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는 형식이 필요하다. – 니클라스 루만 Niklas Luhmann “사회의 예술 Die Kunst der Gesellschaft”
모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관한 고독한 관찰자이다. 예술작품의 창작은 작가가 세계를 관찰하기 위해 특수한 형식을 도입하는 일이다. 이것도 하나의 양식적인 구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술은 작가 혼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며 완성한 작품이 있고, 반대로 여러 명의 시선이 대상을 공유한 결과로 드러난 작품이 있다. 예컨대 인상주의나 표현주의 회화는 앞선 경우에 해당한다. 종교나 신화적 소재를 다룬 미술, 혹은 팝아트는 후자에 속할 것이다. 내가 쓰는 글이므로 내 마음대로 전자를 사적 시선의 미술로, 후자를 공적 시선의 미술이라고 이름 붙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임창민의 작품은 작가가 시선을 독점하는 시적 시선의 미술이다. 왜 그럴까?
작가가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작품 속 공간은 개인만의 공간이 아니다. 미술관의 로비, 호텔 스위트룸, 대학교 건물의 복도와 구내식당 같은 장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시선이 닿았을 그곳에는 저마다 창이 나 있다. 그 창들 너머에는 새하얀 눈이 내려앉은 산기슭,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햇살과 바람을 머금은 나무가 있다. 그것은 애당초 그 누구의 시선으로도 독차지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다. 이런데도 그의 작품이 순전히 개인적인 시선을 담은 미술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음과 같은 징후 때문이다. 정지된 사진으로 찍은 안의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공간의 느낌을 가지며, 움직이는 영상으로 찍은 밖의 환경 또한 작가가 인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고독의 공간이다.
이제 더 이상 화가라고 부를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그가 갖가지 영상 도구 다루면서 서로 다른 매체를 조합하는 기예가라는 점에서, 나는 그가 자신의 솜씨 앞에 경탄하는 관객들을 뒤에서 보며 만족해 할 것만 같다. 마치 영화관에서 필름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영사실 기사처럼 말이다. 여러 해 전에 나는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예술이 가진 패러독스를 수업 주제로 삼은 바 있다. 나는 대학원생들이 예술인 것과 예술이 아닌 것, 즉 예술 작품과 일상의 구분을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 식으로 성/속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 자료는 내가 쓴 여러 편의 소설 혹은 에세이 형식의 짧은 글이었다. 그중 한 편에 작가 임창민이 가상의 인물로 등장했다. 실재와 허구가 뒤섞인 그 텍스트는 작가가 대구의 스페이스 129에서 벌였던 전시를 토대로 한 픽션이었다. 난 여기서 그를 낭만성과 실험성이 결합된 미디어 예술가로 묘사했다. 그의 작업은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알프레토가 영화를 극장 밖의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해서 광장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로 보여주는 카피 레프트의 입장과도 비슷했지만, 그것과는 별도의 유희적 태도로도 보였다.
<미디어 아티스트 L씨가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다. 평론가 Y씨도 그 개인전을 보러갔다. 그런데 Y씨는 전시 중인 미디어 작품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이 작품은 아티스트 L씨가 재작년에 열었던 개인전 작품 이미지였다. 그때 L씨는 자신이 완성한 동영상을 프로젝터로 화랑 벽에 걸린 빈 그림 액자 안에 비추었다. 마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듯하게 말이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서 그는 같은 동영상을 갤러리 벽 대신에, 화랑 옆 건물 벽에 빛을 쏘아 전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전시회는 특별한 시도를 한 새로운 작업인가? 아니면, 자기 작품을 우려먹은 재탕 수법인가?>
예술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생기는 패러독스를 소개한 이 글은 지금 임창민이 드러내는 작품의 기본적인 구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난 아무래도 그가 형식 우선주의자인 것 같다. 물론, 사적인 시선이 화면 속 모든 면을 통제한 내용의 이미지 또한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이 적막하고도 유려한 이미지는 회화와 사진과 영화가 모인 형식의 구성 아래에서 빛을 발한다. 내가 보기에 이 세 갈래의 예술은 그의 작품을 ‘앙상블’로 설명한 많은 비평가들의 생각과 다르게,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낸다. 관객의 인지 체계 안에서 상대를 부정해야 비로소 긍정으로 전환되는 개별자와 전체의 대립은 평면 작업이나 설치 작업이나 상관없이 그의 모든 작업에 숨어있다. 소리 없이 조용한 그의 미디어 작업은 세상의 실존을 순발력 넘치는 이성과 감각으로 쉴 새 없이 몰아가는 미디어 아트의 과격함과 거리를 둔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산뜻한 역설로 봐주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시선의 담지자로서 그는 항상 자신을 둘러싼 주변 공간을 아련하고 느리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정돈된 안식의 지대로 재배치한다. 창문 밖에 존재하는 한결 역동적이며 속도감 있고 소리가 느껴지는(그래봐야 그다지 요란하지도 않은) 바깥의 풍경은 그렇다고 순수한 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대 도시인들의 자연 환경 자체가 실은 인공적으로 조경된 시뮬라시옹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재의 환영은 임창민의 작품 속에서 형식 실험이라는 견고한 틀을 만들어 우리 시선을 잡아 둔다. 결코 뒤죽박죽되어 혼란스럽지 않고 절제된 직선과 원근법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촬영 세트장 형식처럼 제시된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 이 습관적인 배치는 일종의 클리셰처럼 보는 우리들에게 미적인 쾌를 준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고독한 관찰자로서의 대리 체험 그 자체이다. 우리들 누구나 가본 것 같지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장소, 그가 시도하는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 구축은 예컨대 현대미술이 곧잘 선호하는 혁명의 알레고리보다, 서로 다른 요소가 시간 차이를 두고 느리게 쌓인 지층의 비유가 더 합당하다.
(윤규홍, 아트디렉터/예술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