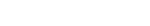유현미 작 ‘After The Show Ends No.2’.
천으로 덮힌 식탁이나 묵직한 돌덩어리가 중력에 역행하며 허공에 부유하고 있는 작품이 전시장 벽면에 걸렸다. 간결한 구성과 절제된 채색만 보면 단촐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알고 나면 작업방식이나 작품의 형식에서 간단하지 않음을 간파하게 된다.
작업 과정은 이렇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인 전시장 벽면이나 천, 돌덩어리에 회화적인 붓칠을 하고, 허공에 식탁이나 돌덩이를 매다는 등의 설치 행위를 더한 후에 사진을 찍는다. 이후 캔버스 천에 촬영한 사진을 인쇄하고, 그 위에 다시 회화적인 터치를 부분적으로 가미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 유현미 작가가 자전적인 소설 ‘적(Enemy)’을 추상적이고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유현미 개인전 ‘적(Enemy)/그림 없는 퍼즐’이 갤러리 분도에서 한창이다. (故) 박동준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박동준기념사업회가 매년 갤러리분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작가들을 초대하는 ‘Homage to 박동준’ 전시에 초대된 전시다. 유현미는 2010년과 2014년에 분도에서 개인전을 열며 작가적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유현미의 작품은 철저하게 협업의 산물이다.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각각의 역할 수행을 하고, 작가에 의해 하나의 작품에서 통합된다. 더 놀라운 것은 자작 소설 ‘적’을 미술 형식으로 가시화 했다는 것이다. 타 장르와의 협업까지 감행한 것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그의 예술 세계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통섭’이다.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형식, 즉 소설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 그의 전시가 가지는 특별함이다.
통섭은 어느새 대세가 됐다. 높아진 상호의존성과 세상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묶는 경우가 많아졌다. 묶으면 보다 높은 확장력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한 우물을 깊게 하는 것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통합이나 통섭에 능한 자가 생존에 유리해진 환경인 것도 현실이다.
그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시대정신인 ‘통섭’을 예술세계에 적용한다. 장르파괴, 장르초월의 경우 예술의 확장력이 더 높아진다고 가정 할 때, 그는 창조적인 진화의 뿌리에 ‘통섭’을 위치시키며 예술의 확장력을 높인다. 문학(소설)과 그림을 하나의 범주에 놓으며 장르를 파괴하고, 하나의 작품에서 사진과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소설에 대한 관심은 독서를 즐겨했던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습관의 연장이다. 독서의 부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시나 소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자신이 창작한 문학과 미술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학과 미술을 다른 영역으로 인식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장르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고, 유기적으로 연결 짓기 시작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두 장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의 작업으로 연결했어요.”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다. 동시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역시 자신의 삶과 동시대의 사회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예술은 생각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동시대성을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인식 세계 확장을 모색한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자신과 동시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소설 ‘적’와 ‘그림없는 퍼즐’을 시각화한 작품들을 걸었다.
갤러리분도 메인 공간인 3층에 자전 소설책 ‘적(Enemy)’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그의 평면 작업 ‘적-자기복제’ 연작을 만난다. 창작과정에서 느끼는 작가의 자기복제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 작업을 돌아보게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한 돌과 캔버스, 테이블 등의 상징물들이 ‘적’ 시리즈의 재료로 축출됐다. “과거에 좋았던 작업이 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지를 다시 살피고, 더 새롭게 깊게 다가가야 할 필요를 느껴 과거의 작업 속 오브제를 활용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창작의 정신을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탐닉해야 한다” 것에 둔 결과다.
다양한 매체와의 협업으로 획득한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 허물기는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에게서 “실제와 환영을 구별해내는 우리들의 불완전한 인식체계에 대한 유머러스한 통찰”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비현실, 삶과 죽음 등의 서로 다른 차원을 때로는 선명하게, 어떤 때는 흐릿하게 경험하는 속에서 나온 주제의식이었을 것이다.
2층 공간에는 ‘퍼즐’ 연작의 신작들을 걸었다. 아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퍼즐이 존재한다는 모순된 상상에서 출발한 이 시리즈는 1998년부터 약 26년간 작가와 함께 성장해 왔다. 조각과 설치작업으로 시작됐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쌓이는 과정을 거쳤고, 2022년에 ‘그림 없는 퍼즐’ 소설로 완성됐다. 소설 ‘적’이 그림보다 먼저였다면, 소설 ‘그림없는 퍼즐’은 그림이 먼저였다.
소설 ‘그림없는 퍼즐’에는 퍼즐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림이 없는 흰색 퍼즐 ‘블랭크’가 가진 고뇌가 현실감 있게 펼쳐져 있다. 그는 소설 속 주인공의 자아 성장 과정을 미술 작품인 퍼즐 연작의 흐름과 유사하게 표현했다. 작품 ‘퍼즐’ 연작 역시 입체와 평면 그리고 영상 등으로 진화해 갔다.
‘퍼즐’ 연작은 작업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작가의 삶의 흔적에 따른 내면의 변화를 솔직하게 담긴 가장 근본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노랑퍼즐’, ‘파랑퍼즐’, ‘자화상’은 감상자들을 작가의 내면이 더 자유롭게 자라나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상상의 세계로 끌어 들인다.
그는 ‘퍼즐’ 연작에서 특히 무의식에 의식을 고정하고는 퍼즐 뒷면을 무의식의 세계로 상정한다. “퍼즐 뒷면은 의식의 뒷면이자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로 치환됩니다. 형태만을 가질 뿐 ‘그림 없는 퍼즐’은 하나의 퍼즐 전체 안에서 무의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적’이나 ‘퍼즐’ 연작에 등장하는 식탁이나 퍼즐은 인간을 은유한다. 특히나 수백에서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의 형태가 제각각인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인간마다 가지는 독자성에 대한 표현이다. 그가 “한 사람은 곧 우주”라는 논리를 폈다.
먼저 돌과 우주의 관계를 설명했다. 돌을 확장하면 지구가 되고, 지구를 더 멀리서 바라보면 별이되며, 그것은 곧 우주인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역시 소우주라는 이론이 성립된다. 그의 ‘적’이나 ‘퍼즐’ 연작에는 이처럼 우주적 인간에 대한 예찬이 담겼다.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서울대 조각가 출신이라는 작품의 배경은 그의 그림을 특별함으로 이끄는 지점이다. 이 두 형질에 의해 그의 그림은 또 하나의 독특성을 잉태한다. 바로 연극적인 설정이다.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것도 연극성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지만, “인생 자체가 연극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그의 시각도 한 몫 한다. “돌과 하늘과 땅은 자연을 상징하지만 식탁은 인간에 대한 은유입니다. 다양한 상징물로 연극적인 요소로 치환하지만 굉장히 단순화하면서 긴장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두 개의 시리즈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해석이 다분히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그는 고장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믿는다. 많은 것에 열려있으려는 태도가 그를 소설을 쓰게 하는 이유다. 누군가는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지만 그는 그림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떠오르는 상상을 소설로 쓰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만이다. 의식이 무뎌지거나 멈추지 않은 한 그는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시는 5월 24일까지.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