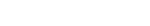갤러리분도 전시장에 울창한 숲이 펼쳐졌다. 유봉상 작가의 개인전 ‘Greenland’에 소개된 작품들이다.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당혹감이 밀려온다. 사진인지, 그림인지가 명확치가 않다. 사진인가 싶으면 그림 같고, 그림인가 싶으면 깊이감이 예사롭지 않다. 모호한 상황에서 혼란해질 즈음 유봉상이 “사진과 그림이 혼재됐다”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그의 힌트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트릴 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묘한 그 무엇이 있음을 직감할 즈음, 그제야 그가 “풍경 사진 위에 못을 꼽고, 그 위에 다시 물감을 칠했다”며 작품 제작 과정을 소개했다. 그의 풍경은 수십 만 개의 날카로운 못으로 구현한 풍경이다.
못을 회화의 재료로 채택하기 이전, 그는 추상적인 단색화에 집중했다. 그때부터 다양한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고, 물성 실험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던 때였다. 특히 납판이나 알루미늄, 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실험을 거듭했다. 그러다 못에 대한 실험으로까지 이어졌고, 의외로 못에서 리듬감을 발견했다. 못이 화폭 위에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못을 하나하나 점점이 박으면서 선으로 연결되고, 선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업 초기에는 일반적인 못을 사용했다. 그러나 작업과정이 어려웠고, 못을 군집했을 때 나타나는 무게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그때부터 바늘만큼 가는 스테인리스 못으로 기존의 못을 대체됐다. 사용하는 못의 개수도 소량에서 대량으로 변화했다.
자연의 이미지를 그린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프랑스에 체류하며 보스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것이 이유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풍경에 못을 개입시켰고, 구상적인 요소가 짙어졌다. 순전히 물성이 이끈 변화였다. 풍경과 못이 만나자 풍경 속 서사는 한층 깊어졌다.
“못의 효과에 의해 생겨난 리듬감에서 바다를 떠올렸고, 못을 사용해 풍경 같은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업 과정은 지난하다. 먼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촬영할 풍경을 찾고, 그곳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는다. 장소는 국내일수도 있고, 해외일수도 있다. 사진 촬영이 끝나면 현수막 천에 출력하고, 이를 나무에 고정한 후에 이미지를 따라 못을 박는다.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분사하고, 다시 못을 정교하게 갈아낸 못 위에 색을 올리면 그제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 “가로, 세로 100×150cm 크기의 화판에 30만 개 정도의 못이 사용됩니다.”
풍경을 직접 그려서 못을 꽂아도 될 일이다. 그런데 그는 왜 굳이 풍경 사진을 밑바탕으로 사용했을까? 그가 “내 데생력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겐 숲이 필요했고, 사진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사진을 밑그림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밑바탕으로 했을 때, 직접 그렸을 경우와 또 다른 재미적인 요소도 있었다.
못이 재료인 만큼 그의 작업실 또한 예사롭지 않다. 다양한 공구들이 작업실 곳곳에 배치 돼 있다. 작업 초기에는 망치로 못을 박았지만, 못 사이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자 ‘태커’(tacker)로 대체했다. 작업의 미학은 7mm에 있다. 못을 박을 때, 대가리를 제거한 15mm 헤드리스 핀못을 에어태커를 이용해 8mm만 박아 넣고 나머지 7mm는 남긴다. 그 남겨진 7mm의 미학이 빛과 만나면 몽환적인 깊이감으로 드러난다.
그림은 일루전(illusion, 착시)의 예술이다. 시각적 요소를 이용해 현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림의 역할이다. 의식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가 못을 선택한 배경에도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는 숲속 풍경이나 책에 기록된 문자 등을 밑그림 레이어(층), 못 그늘 레이어, 헤드에 올려진 색 레이어로 묘사한다. 이 조합에서 그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루전을 발견하길 바랐다.
화면 속 풍경에서 전해지는 서정은 평온함이다. 그런데 ‘숲=평온’이라는 공식은 진부할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숲이 가진 편안한 정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믿는다. 그에겐 편안한 정서가 감동의 또 다른 표현으로 다가온다. “제가 추구하는 그림은 조금이라도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풍경이나 예쁜 색채는 그것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작품이 커질수록 적지 않은 노동이 투입된다. 100호 규모일 경우 30만개 정도의 못을 박는다. 일일 최대 노동량은 4~5만개다. 30만개의 못을 박으려면 적어도 6일 정도는 걸린다. 그러나 그는 노동은 노동일 뿐, 노동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노동은 저의 몫이고, 감상자에게는 편안한 그림이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못을 박을 때 적용되는 기준은 질서와 무질서의 공존이다. 사실 그는 자신의 화면에서 이중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실제로 질서와 무질서, 기계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차가움과 따뜻함을 하나의 화폭에 병치한다. 풍경을 선택할 때 감성을 개입시키지만, 이후의 작업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 하에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감정과 이성, 질서와 무질서의 공존은 그에겐 풍경의 서사와 회화적 깊이감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저는 풍경 속에 이중적인 분위기가 있기를 바랐어요.” 전시는 4월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