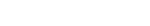민성홍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분도 전시장 전경. 갤러리분도 제공

박동준상을 수상한 민성홍 작가. 이연정 기자
12월 8일까지 갤러리분도서 수상전시 ‘수신체와 발신체’
‘우리집에도 분명 저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버린걸까. 손때 묻은 그 물건은 어디로 갔을까. 이 가구의 부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쓰던걸까. 왜 버려진걸까.’
민성홍(51) 작가의 작품은 서로 다른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다 버려진 다양한 물건과 소재들의 조합으로 탄생한다.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그 물건이 작가의 손에 수집되면서부터 눈 앞에 작품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파편들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물건에 담긴 여러 삶의 기억과 흔적은 다시 새로운 상황 속에 놓여져 다른 삶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된다.
추계예술대와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작가는 사진, 조각, 설치, 회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오며 미국 뉴욕, 벨기에 브뤼셀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2014년 국내 시각예술을 주도하는 3040 작가 30명의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현대차 프로젝트 ‘브릴리언트 30’ 선정, 2019년 우민미술상 수상으로 주목 받은 데 이어 최근 박동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최근 박동준상 수상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분도에서 만난 민 작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작가인 뮌 듀오에 이어 박동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이 공간에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작업은 어쩌면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셈. 실제로 그는 대학 시절 ‘바깥미술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야외 설치미술 작업에 몰두하는 등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 유학 시절부터는 좀 더 시선을 넓혀 얼음, 목탄가루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 등 시간성, 물성에 대한 작업을 이어왔다.

민성홍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분도 전시장 전경. 갤러리분도 제공
귀국 후 그는 희한한 풍경을 마주한다. 가족들과 30여 년간 함께 살았던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촌이 재건축 대상지가 되면서 이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떠났고, 골목마다 그들이 버린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던 것.
“한 공간에서 누군가가 살아가며 경험한 기쁨과 흥분의 순간이, 혹은 힘겨움과 고달픔 끝에 이룬 성취감이 묻어있는 사물들이 허물처럼 덩그러니 버려진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의 외부 작용(재건축)으로 인해 위치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사물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함으로써, 주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계성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유독 공중에 떠있거나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거나, 바퀴가 달려있는 것이 많다. 작품 타이틀도 ‘가변성을 위한 연습’, ‘유연성을 위한 연습’, ‘임시성을 위한 연습’, ‘예민성을 위한 연습’과 같은 것들이다.
작가는 “거주지가 부숴지고 새로 지어지고, 그에 맞춰 부지런히 옮겨 다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견고한 지지체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 제목은 ‘Receiner and Tranmitter(수신체와 발신체)’. 그가 지금까지 펼쳐왔던 작업에 대한 정의와도 같은 전시다.
그는 “내 작업이 이제 어떤 진행 방향이나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올해 많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며 “결국 내가 작가로서 하는 행위는 외부의 사물, 상황들을 작업실이라는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안테나와 같은 수신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공중에 매달린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회전하며 반응하는 발신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바깥에서 수집한 사물들을 작업실 안으로 들이는 작업을 해온 작가는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해나가는 작업으로의 변화를 고심 중이다.
그는 “공간의 경계를 뚫고 퍼져나가는 개념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 내 공간과 다른 사람들 공간 사이의 벽을 아주 얇게 만듦으로써 관계의 경계를 좁히는 작업을 하려 한다. 수신체와 발신체라는 주제를 확장해나가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2월 8일까지.
매일신문
이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