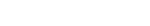보이는 것 그대로를 믿으시나요?
김현석 개인전
캔버스 위에 어느 정도 공간을 띄우고 철사나 노끈 따위의 재료를 붙였다. 여기에 조명을 조절하니 슬며시 그림자가 드리운다. 단순하게 구성된 화면이지만 뭔가 묘하다. 가만 보니 그림자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다. 화면에 닿을 듯 다가서니 그제야 ‘아차!’ 싶다. 그 그림자는 모두 작가가 교묘하게 나타낸 일루젼 더미였던것. 김현석 작가는 이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말하자면 허구를 그렸다. 그렇게 허상을 채운 그의 작품은 진짜 실존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날카롭게 질문한다.
“직접 감각하는 세상마저도 왜곡된 것일 수 있어요. 실체가 있어도 그 실체를 관습에 의지하여 대충 보고 느끼기 일수니까요. 익숙한 감각에 교란을 야기하는 제 그림은 물체와 빛, 그림자, 그리고 그것이 놓인 공간과 그림자의 관계를 돌아볼 뿐 아니라 드러나고 숨겨진 것,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생각과 세상을 보는 마음 구조에 대한 깨달음이자 성찰입니다.”
경험으로 견고히 쌓은 관념. 그 사이 허점이라는 과녁을 정확히 명중하는 작가의 작품은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실제와 관념 사이에 여백이 있음을 지각하게 한다. 감각, 지각, 인지 행위까지…. 그 모두를 화면으로 끌어오는 그의 미술적 성취는 40여 년을 천착하여 얻은 고된 작업의 산물이다. 작가는 이렇게 관습과 생각을 줄곧 의심하였다. 그런 그의 작업은 마침내 옳고 그르다는 세상의 또렷한 이분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희석시킨다.
오랜만에 개인전을 여는 작가는 그간의 반입체 회화를 놓고 평면으로 구현한 새 시리즈를 들고 나왔다. 화면은 여전히 단순하다. 색이 있는 물체와 그것이 놓임으로써 벌어지는 화면의 동태를 스케치한 흔적이 가만히 놓였다. 작품은 정교하게 계산해 똑같이 구현한 3개 작품이 한 쌍이다. 너무도 같은 화면의 연속속에서 다름을 보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관건. 작가는 이렇게 또 다른 일루젼으로 질문을 이어간다. “우리는 쏟아지는 빛의 판타지 속에서 대상을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깊이 의심해보세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경계 짓는 인식 체계, 또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축하는 마음 구조에 대한 깨달음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 월간 대구문화